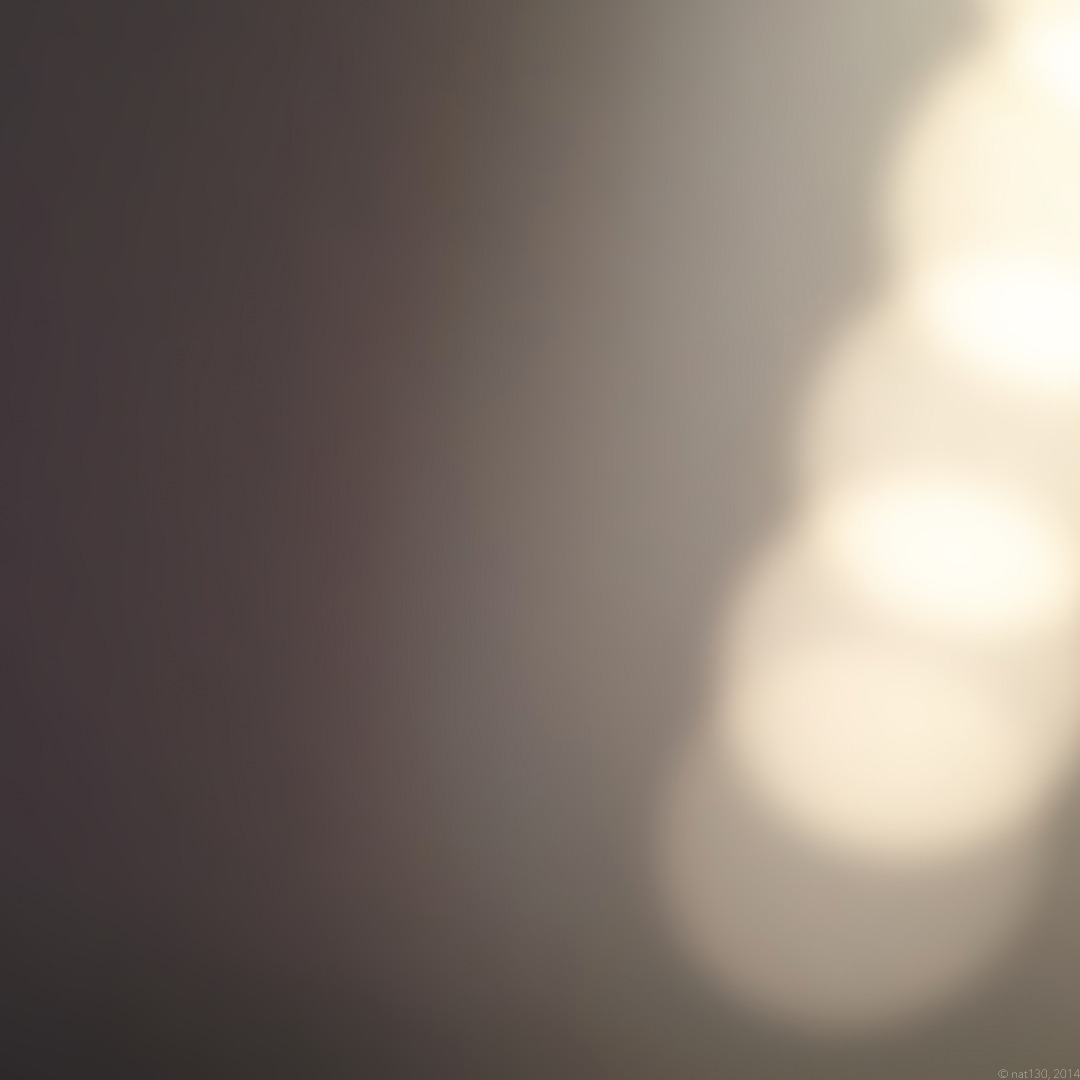1) 죽음은 삶과 연속적이다. 죽은 자는 우리 곁에 있다.
2) 죽음은 축제이다. 죽은 자도 산 자도 흥겹게 노래하며 즐긴다.
3)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비극적이다.
4) 고통스럽거나 비참한 죽음은 비극적이다.
*
1)은 한국의 문화와 멕시코의 문화를 함께 관통한다.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<코코>를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.
2)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. 멕시코인들은 망자를 위한 제단을 화려한 색으로 꾸민다. 망자의 날엔 음악과 춤이 끊이질 않는다. <코코>에서 망자의 세계는 해골들의 잔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 같다. 반면 한국의 제사는 엄숙주의로 무겁게 짓눌려 있다.
1)과 2)는 삶과 죽음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전통적인 태도이고 <코코>의 배경이다. 픽사는 3)을 끌어들여 그 배경을 보편적인 감동으로 만든다. 어느 문화권에서는 낯설 1)과 2)를 상투적인 3)이 상쇄한다.
*
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소멸은 축복이다. 잊혀지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. 오히려 사람은 적극적으로 잊혀져야 한다. 소멸은 진보의 조건이고 망각 너머엔 새로운 관계가 있다. 이별이 성장의 단계를 이루는 작품들이 괜히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다.
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프지만, 그건 소멸 자체와는 다른 이야기다. <토이 스토리 2>에서 제시의 회상 장면과 <토이 스토리 3>의 결말 장면의 차이이다. 나는 <토이 스토리 3> 결말과 <인사이드 아웃> 빙봉의 최후에서 슬픔을 못 느끼겠다.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<코코>의 테마는 와닿지 않았다. 비극적인 건 죽음 일반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, 고통스러운 죽음, 부당한 죽음이다. 4)는 나의 견해이고 여기엔 소멸과 상실을 똑같지 보지 않겠다, 후자는 비극적이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.
*
1)과 2)로 함축되는 멕시코인들의 사고가 반드시 3)으로 연결될까? 모두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다는 점에선 그렇다. 하지만 2)의 태도는 3)의 우울한, 네크로필릭한, 반동적인 감상주의와는 다르다. 2)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, 극복을 위한 의지와 연관된다.
<코코>가 효과적이었다면 그건 2) 같은 낙천주의로 틀과 결말을 짠 다음 3)의 촉촉한 감상으로 내용을 채워넣었기 때문이다. 3)은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. 하지만 그 끈적한 감상주의가 나를 자극시키긴 했다. <코코>는 감동적이라기보단 감동을 받고 싶게 만드는 편이었다.